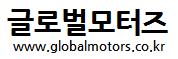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클래식카 시승에는 1세대 170V-170DS(1947~1955년, W136), 2세대 180D-190 폰톤(1953~1962년, W120), 3세대 190D-230D 테일핀(1961~1968년 W110), 4세대 200D-280E 스트로크(1968~1976년, W114·W115), 5세대 200D-280E(1976~1986년, W123·V123·S123·C123), 그리고 6세대 200D-E600 AMG(1984~1996년, W124·S124·C124·A124) 총 6대의 E-클래스가 준비됐다.
한정된 시간 관계상 모든 모델을 타볼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줄을 섰다. 우연히 기자의 시간 여행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부터 거꾸로 올라갔다. 우선 첫 번째 시도는 1세대다. 정확하게는 1952년부터 생산된 1.7ℓ 디젤 엔진이 얹혀 있는 170 DS 모델이다.
새까만 보디 컬러에 둥그런 헤드램프, 전면을 가득 채운 방패형 그릴, 바퀴를 감싼 커다란 돌출형 휀더가 마치 영화 소품을 보고 있는 듯하다. 휀더 사이 윈드스크린에서부터 앞쪽 그릴까지 역삼각형으로 쏠린 보닛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클래식카의 디자인 요소다.
실내에 탑승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림이 얇은 스티어링 휠이다. 그립감은 헐겁다. 그냥 몽둥이를 쥐고 있는 느낌이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편으로는 총 4단 변속이 가능한 수동 레버가 있다.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왼쪽 허벅지를 바라보고 있는 레버식 핸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풀어야 한다. 참고로 수동 변속기는 ‘P’ 모드가 따로 없으므로 핸드 브레이크가 필수다.

엔진을 깨우기 위한 별도의 버튼을 누르고 꽂혀 있는 키를 돌리면 출발 준비가 완료된다. 엔진음은 우렁찼지만, 불쾌감은 들지 않았다. 이런 영광을 누리면서 잡음에 대한 불평은 금물이다. 뻑뻑한 클러치를 꾹 밟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변속 레버를 가슴쪽으로 당겨 1단에 집어넣고 오른발로 가속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다시 밟고 있는 왼발에 힘을 풀며 클러치를 놓는다. 자랑은 아니지만, 시동을 꺼트리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반 클러치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실수였다. 공회전 소리가 심하게 들렸지만, 중요한 건 출발이다. 시승차는 2단에서 3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헤매기 일쑤였다.
1단에서는 시속 약 10~20km까지 오르고 2단에서는 시속 약 20~30km 사이에서, 그리고 3단은 시속 40km 정도에서는 바꿔줘야 한다. 마지막 4단에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시도조차 못 했지만, 대략 80km까지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거 같았다. 속도계는 140km까지 기록돼 있지만, 급격한 내리막길이 아닌 이상 바늘이 닿기 힘든 경지가 아닌가 싶다.

자신감이 붙었다. 두 번째 올라탄 차는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는 4세대 250 모델이다. ‘폰톤’과 ‘테일핀’을 건너뛰었다. 참고로 ‘폰톤’은 1세대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온 휀더가 쑥 들어간 것을 말하며, 테일핀은 후방 트렁크 끝부분에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어진 별명이다. 4세대 모델은 ‘스트로크 8’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출생연도와도 관련 있지만, 이전 모델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첫 밀리언 셀러까지 올랐던 4세대 모델은 확실히 좀 더 현대적인 이미지다.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있고 변속 레버 역시 스티어링 휠 뒤편이 아닌 센터콘솔 바로 앞에 위치했다. 기어는 여전히 4단. 1단부터 4단까지가 별도로 체결부가 있으니 수동식 자동 변속기인 셈이다. 하지만, 시승에는 상시 4단에 놓고 출발한다. 가속페달이 말을 잘 안 듣지만, 속도는 빠르게 올라간다. 1세대 모델에서 걱정했던 제동 문제는 한시름 놨다. 차체도 시트포지션도 낮으니 코너링에서도 좀 더 자신감이 붙는다.

세 번째 만난 E-클래스는 5세대 200T 에스테이트 모델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운전의 재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 게다가 이 모델은 1977년 처음으로 적용된 왜건이다. 이 차를 시작점으로 유럽에서의 벤츠 왜건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건 마니아를 자처하는 기자로서는 꼭 타봐야 하는 차 중의 하나였다.
둔해 보인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오히려 실용성을 조금 가미했을 뿐이다. 가속감도 훌륭하다. 변속기는 아직 4단, 레버도 여전히 센터콘솔 앞에 있다. 다만, 이번에는 수동이다. 후진이 1단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rpm 구간이 비교적 꽤 길다. 2단과 3단에서 이미 시속 80km를 넘어선다. 물론 알맞게 변속한다는 가정하에서다. 4단으로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까지 올라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다.
와인딩 코스도 만족스러웠다.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는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Anti-lock Braking System)이 최초로 적용된 차로도 기록에 남아 있다. 5세대 왜건의 또 다른 장점은 드넓은 적재 공간이다. 밋밋하게 각진 후방 해치를 열면 현대식 왜건들보다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거 같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잠시 타본 차는 6세대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모델로 한국의 도로에서도 이 차의 흔적을 자주 볼 수 있다. 쌍용자동차(KG모빌리티 전신)의 1세대 체어맨이 이 차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한다. 벤츠와 쌍용차와의 관계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건, 둘 다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것이다. 시승차는 정확히 포르쉐와 공동개발했다는, 나름 고성능 ‘E 500 리미티드’ 모델이다. 1994년형으로 V8 5.0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 5600rpm에서 320마력의 최고출력을 낸다. 최고시속은 250km에 걸려있다. 다만, ‘고성능’을 염두에 둔 탓인지 실제 주행 느낌은 기대에 못 미쳤다. 에어컨을 틀고(맞다. 이 차는 에어컨이 아직 작동한다) 가속을 하면 세월이 흐르며 눈높이가 달라져서일지도 모른다.
이 모델은 당시에도 희귀한 차였다. 오직 500대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날 준비된 차 중 가장 짧은 연식이지만 가장 비싼 차가 아닐까 싶다.
벤츠는 이런 고전 모델들을 별도로 모아 놓는 부서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험의 기회는 더 희박해질지도 모른다. 짧았지만, 임팩트 있었던 E-클래스의 고전 모델 시승, 자동차 전문 기자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거 같다.
육동윤 글로벌모터즈 기자 ydy332@g-enews.com 육동윤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